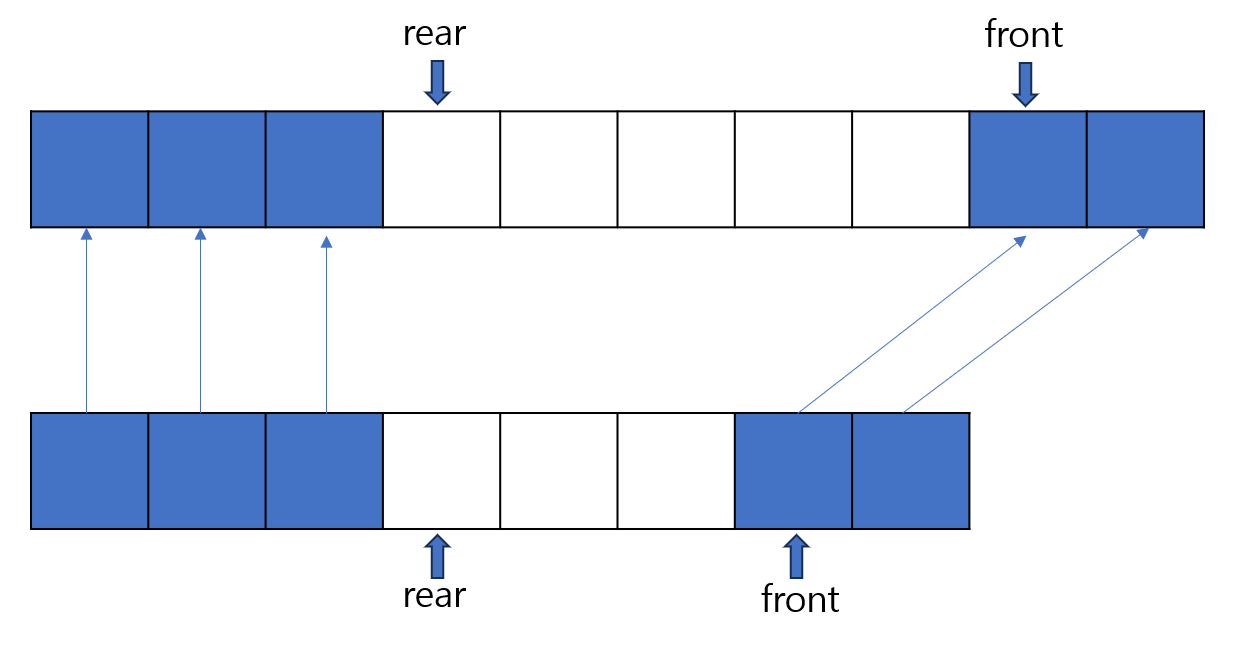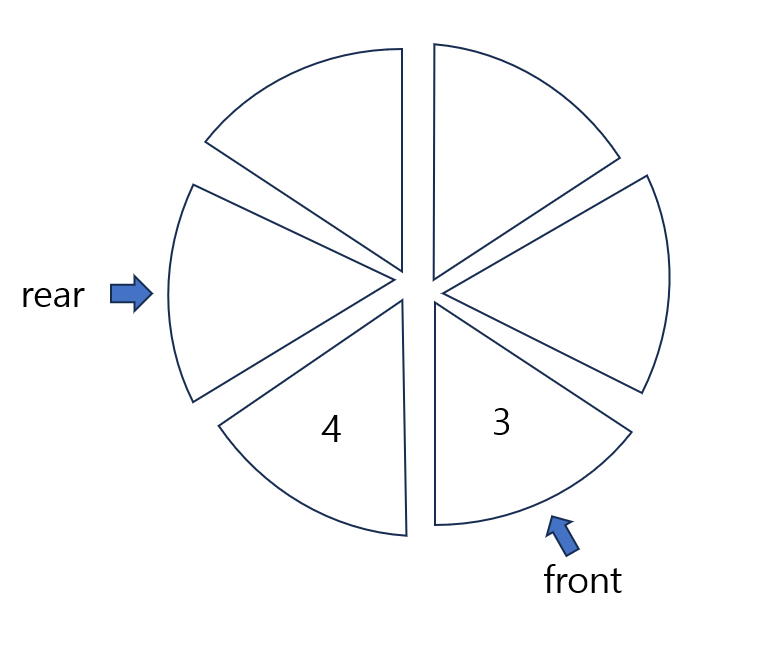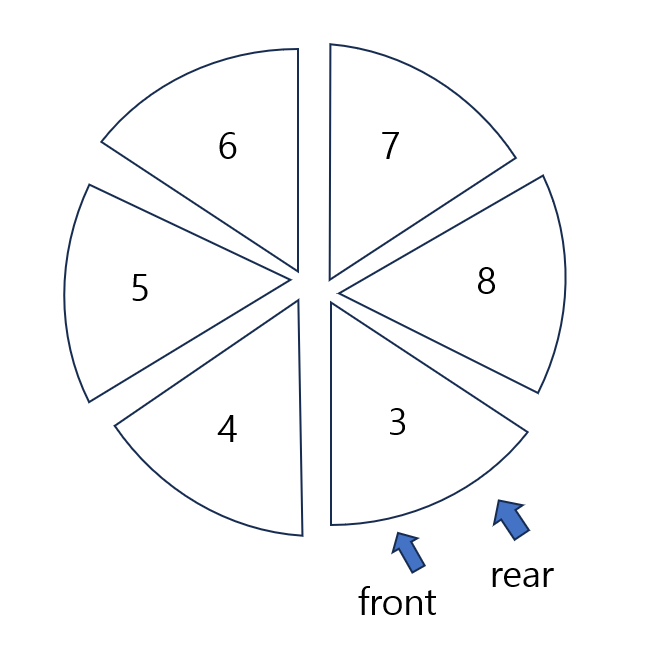3/10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망칠 수 있나. 그래서 더 아쉬운 영화.
파묘는 토속신앙을 다뤄서 일본귀신을 때려잡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토속신앙을 다루는 영화중 이렇게 흥행이 된 영화는 없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나도 기대해서 봤지만 아주 기대를 깎아 먹었다.
박지용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지용(배우 김재철)이 파묘를 의뢰했지만 김상덕(배우 최민식)은 묫자리가 너무나도 안좋아 거절하면서 차에 탔는데 맞은편에서 박지용이 최민식을 뚫어지게 보는 장면을 보고 나는 박지용에게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결국 다시 박지용, 김상덕, 이화림(배우 김고은) 셋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김상덕은 박지용에게 숨기는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결국 파묘가 성사 되었다. 대살굿 장면은 인상적이긴 하지만 와닿지는 않는다. 박지용은 파묘후 묘는 개관을 하지않고 그대로 화장해달라고 했고, 개관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는다. 보국사 보살에 의해 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엔 금은보화가 있을거라고 했으니 박지용이 개관하지 말라는 이유는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명의 욕심으로 개관을 했더니 금은보화랑 상관없이 묘에서 혼령이 빠져나와 스토리가 진행되는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지용은 혼령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개관을 하지 말라고 한것인가? 그렇다면 박지용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존재인가? 그러나 전혀 아니다. 박지용이 혼령의 존재를 알고있으리라는 증거도 없으며 그 혼령에게 죽어버리기 때문.
이 모든 과정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1. 파묘를 하지 않겠다는 김상덕을 뚫어지게 보는 박지용.
2.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개관을 하지 말라는 박지용.
3. 묘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혀 상관없는 혼령이 등장.
4. 그 혼령에게 죽는 박지용.
결국 박지용은 우리에게 의문만 남긴채 죽어버린다. 혹은 정말 의미가 없은 박지용의 행동이다. 그저 이야기를 전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
'여자얼굴의 뱀'은 무엇인가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파묘후 한명의 인부가 삽으로 '여자얼굴의 뱀'을 죽여 비명소리만 남기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스토리가 흘러간다는 뜻이지만,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
1. 왜 거기에 '여자얼굴의 뱀'이 있었는가?
2. 첩장이여서 있었다면 왜 첩장엔 '여자얼굴의 뱀'이 있어야 하는가?
3. '여자얼굴의 뱀'의 비명소리가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을 알렸다면 굳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화 내에선 이 질문에 대답이 없다. 아무리 강렬한 장면이지만 의미가 없다.
혼령은 실체가 있는것인가
개관후 튀어나온 혼령은 후손인 박지용일가를 죽이려고 한다. 마치 혼령은 투명인간처럼 물리적인 능력이 있어보인다. 그러나 박지용의 형과, 두번의 유산 그리고 박지용의 아들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개관하기 전부터 그랬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관으로 인해 혼령이 빠져나오지 않았어도 혼령은 충분히 박지용일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빠져나온 혼령은 천천히 한명씩 죽이게 되며 박지용의 아이는 천천히 죽이려다 혼령이 당하게 된다...
1. 혼령이 빠져나오기 전은 힘이 약했던가?
2. 혼령이 빠져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것인가?
3. 혼령은 김상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폰이 없어도 전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것은 어디서 온건가?
개관은 그저 혼령이 쎄져서 영화를 단순히 급박하게만든 역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챕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영화는 6개의 챕터가 있는데 챕터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챕터가 없었어도 이야기는 충분히 흘러갈 수 있고 오히려 챕터 때문에 다른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동티챕터에서 '여자머리의 뱀'을 통해 첩장이란것을 알게 되는데 동티 챕터는 결국 첩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럴꺼면 챕터흐름을 동티로 잡고 하던가 첩장이라는 챕터를 쓰던가 챕터 이름이 첩장인 것 자체가 스포라면 다른 이름을 쓰던가 아니면 챕터를 쓰지 않거나 하는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챕터에서 비중없이 다루는 이야기를 챕터이름으로 쓰는것은 난 잘 모르겠다.
두개의 묘
우린 두개의 묘를 봤다. 박지용조상의 묘와 첩장. 이것은 한국귀신과 일본귀신의 차이를 보여주며 한국귀신은 원한만 풀어주면 해결이 되고, 일본귀신은 원한과 상관없이 '악'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보여주지 못한것 같다. 결국 박지용조상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한채 묘를 태워서 없앴고, 일본귀신도 그냥 죽여버렸는데 한을 풀어주는게 중요한가 싶다.
고증
영화에서 고증은 그저 선택지중 하나다. 특정한 장르(역사 등)를 제외하면 고증을 지키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 고증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면 고증에 대한 재미를 관객은 느껴야한다.
파묘는 고증을 아주 잘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정작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설득되지 않았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토속신앙의 행동들의 대부분은 설명없이 진행한다. 대살굿의 준비물 및 과정, 김상덕이 묫자리에 100원을 던지거나 등등.. 이런것들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아~ 대살굿은 저렇게하는거고 파묘를 하면 100원을 던지는것이 상도구나~' 그러나 몇몇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고증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한다.
1. 일본귀신은 왜 은어와 참외를 원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분명 고증인데 최소한의 설명이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2. 일본귀신은 윤봉길(배우 이도현)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축경을 피해서 공격했는가? 그렇다면 김상덕의 축경은 왜 피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했는가?
영화 내에선 설명이 없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점에서 고증자체는 중요하지않고 맥락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파묘의 고증이 잘 되어있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증인지 모르겠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파묘는 좋은 소재라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쉽다. 참 아쉽다... 장재현감독은 검은사제들,사바하같은 오컬트 영화를 감독한 경험이 있는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파묘를 왜 이렇게까지 밖에 못한지 참 아쉽다.
'영화 감상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테넷 감상평 스포있음 (0) | 2024.09.07 |
|---|